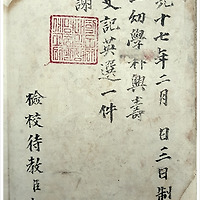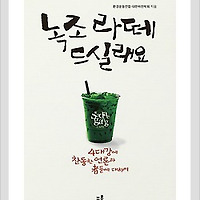[讀.啓.肥(독.계.비)] ‘독서로 계명을 살찌우자’라는 목표로 릴레이 독서 추천 형식으로 꾸며가는 코너입니다. 책을 읽고 그에 대한 소감과 함께 원하는 사람에게 추천해 주고, 그 사람은 추천받은 책을 읽고 난 후 또 다른 책을 본인이 원하는 사람에게 추천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호에는 김준석(신소재공학과3)군에게 「변신/시골의사」를 추천받은 임영빈(문예창작학과3)군이 「채식주의자」를 최창환(신소재공학과3)군에게 추천합니다.
‘채식주의자’의 2016년 5월 맨부커상 인터네셔널상 수상 덕분에 예전에 읽었던 기억에 기대어 다시 한 번 재독을 하게 됐다. 원래 재 조명이란 게 그렇다. 알고 있거나 인식하고 있던 체계들을 자연스레 재 정비하고 되새기게끔 유도한다. 재독의 과정 속에서 새삼 느낀 건 한강의 작가정신. 그녀가 어떤 사건이나 사물을 바라보는 과정은 마치 유빙이 만들어지는 순간의 포착과도 같다.
위태로운 일상, 균열, 틈새 사이에서 서사는 수축되고 팽창되기를 반복한다. 그 과정이 어떤 단단한 얼음결정을 만들어낸다. 예컨대 영혜를 바라보는 남편의 시선(채식주의자), 영혜를 갈구하다 결국 파국에 치닫고 마는 형부의 시선(몽고 반점), 모든 것을 잃은 채 영혜의 피폐함을 바라보는 언니 인혜의 시선(나무 불꽃)은 모두 영혜를 바라보는 주변인의 서사다. 영혜는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는다. 거기서 울림이 발생한다. 우리의 일상에 대해 생각해보자.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이나 누군가를 판단하고 그 내용을 제3자에게 전달한다.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상대의 본질은 호도되고 말하는 이의 입맛에 맞게 변질된다. 그렇게 폭력이 생산된다. 또 있다.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탈’이란 말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만큼 많은 종류의 억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 아닌가. <채식주의자>가 목도하는 지점은 바로 그것이다. 돌연 채식주의자가 되겠노라 선포한 영혜에게 가해지는 주변인들의 조롱과 압박. 내 옆의 누군가가 나와 다른 것을 참을 수 없는 거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영혜의 남편과 형부, 언니 모두에겐 이해와 존중이 결여되어 있다. 판단만 있을 뿐.
소설 속에서 영혜는 어떤 광기에 사로잡히고, 나무가 되려한다. 정신병원에 갇힌다. 언니는 마지막 남은 책임감으로 그런 그녀를 보살핀다. 기묘하다. 언니로서의 책임감은 왜 어떤 사실이 드러났을 때만 발동하는가? 이건 보편적인 문제다. 이세상의 모든 책임은 대단원이 끝난 다음, 결과 너머에 존재한다. 한강의 불편함은 이런데서 비롯된다.
무수한 사실과 사실 사이에 불편하게 끼어있는 진실을 텍스트에 담아내는 것. 그녀의 소설이 번역되고, 세계 3대 문학상인 맨부커상에 노미네이트 된 까닭은 바로 그런 그녀의 작가정신 때문이 아닐까.
책을 덮은 후, 가만히 생각했다. 내 인식 속에는 과연 혐오의 정서가 없었는가? 그럴리가. 그건 생각보다 간단한 일이다. 요즘은 혐오가 당위성의 갑옷을 두른 채 뻔뻔하게 고개를 쳐든다. 약간의 다름도 손쉽게 틀리다고 정의내리고 신이라도 된 듯 심판하고 있진 않은가? 어떤 감정이 피어오른다. 그건, 부끄러움이다. 주변에 싫어하는 사람이 손가락으로는 다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면, 조용히 <채식주의자>를 집어 들어라. 그리고 느껴라.
사진출처: 네이버 책
<편집위원 이영숙, 학술정보지원팀 수서실>
'2016 > 101호(11월)'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고문헌 산책 9] 어정사기영선 (0) | 2016.11.09 |
|---|---|
| [북-ing] 환경을 지켜줘! (0) | 2016.11.09 |
| [씽!씽!] 나누미와 함께한 북소리 축제! (0) | 2016.11.09 |
| [핫뉴스] 11월의 풍요로운 소식 (0) | 2016.11.09 |
| [Library & People] 전자무역학전공 이승희 학생과의 인터뷰 (0) | 2016.11.09 |